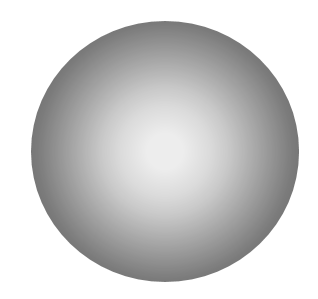원자 모형
"오늘의AI위키"의 AI를 통해 더욱 풍부하고 폭넓은 지식 경험을 누리세요.
1. 개요
원자 모형은 원자의 구조를 설명하기 위한 다양한 모델의 변천사를 나타낸다. 돌턴 모형은 원자를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단단한 구로, 톰슨 모형은 원자 내부에 전자가 박혀 있는 형태를 제시했다. 러더퍼드 모형은 원자핵의 존재와 전자의 궤도를 설명했으며, 보어 모형은 전자가 특정 궤도에서 에너지 방출 없이 안정적으로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현대 원자 모형은 전자의 위치를 확률 분포로 나타내는 등 양자역학적 개념을 도입하여 원자 구조를 더욱 정교하게 설명한다.
더 읽어볼만한 페이지
- 모델링 (과학) - 맞춤의학
맞춤의학은 환자의 유전적, 분자 생물학적, 세포적 특징을 고려하여 개인에게 최적화된 치료법을 제공하는 의료 모델로, 더 나은 진단과 효율적인 약물 개발, 표적화된 치료법을 제공하지만 데이터 관련 문제와 규제 및 윤리적 문제 등의 과제를 안고 있다. - 모델링 (과학) - 세계관
세계관은 개인이 세계를 바라보는 방식이자, 철학, 신화, 종교 등 다양한 분야에서 나타나는 기본적인 신념과 가치관의 체계이다. - 원자 - 원자핵
원자핵은 원자 질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양전하 입자로, 양성자와 중성자로 구성되어 핵력에 의해 결합되어 있으며, 양성자 수는 원소 종류, 중성자 수는 동위원소를 결정하고 핵융합 및 핵분열 연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 원자 - 혼성 궤도
혼성 궤도는 분자의 결합과 구조를 설명하기 위해 원자 오비탈들이 혼합되어 형성되는 새로운 궤도로, 유기 화학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분자 궤도법만큼 정량적인 계산에는 실용적이지 않다. - 핵화학 - 핵분열
핵분열은 원자핵이 중성자와 충돌하여 두 개 이상의 조각으로 분열되는 현상으로, 막대한 에너지를 방출하며 원자력 발전과 핵무기에 응용되지만 방사성 폐기물 처리 등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 핵화학 - 핵폭발
핵폭발은 원자핵 반응으로 막대한 에너지를 방출하는 현상으로, 핵무기에 이용되거나 평화적 목적으로 활용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며, 폭풍, 열복사, 방사선, 전자기 펄스 등으로 피해를 야기하고 핵겨울을 초래할 수 있다.
2. 변천사
19세기 초, 존 돌턴은 모든 화학 원소가 변하지 않고 파괴할 수 없는 한 종류의 원소들로 구성되고 그것들이 결합하여 더 복잡한 구조(화합물)를 이룬다는 원자 이론을 발전시켰다.[1] 돌턴이 이 이론에 어떻게 도달했는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원자설을 통해 화학 분야에서 당시 과학자들이 이룬 많은 발견들을 설명할 수 있게 되었다.
3. 돌턴 모형
돌턴은 조제프 루이 프루스트의 업적을 연구하고 확장하여 배수 비례의 법칙을 발전시켰다. 이 법칙은 두 원소가 하나 이상의 화합물을 만드는 경우에는 첫 번째 원소 일정량과 결합하는 두 번째 원소의 질량 사이에 간단한 정수비가 성립한다는 것이다.
또한 돌턴은 물이 기체마다 다른 비율로 흡수하는 현상도 기체 입자의 질량과 복잡도의 차이로 설명했다. 예를 들어, 물은 질소()보다 이산화 탄소()를 더 많이 흡수하는데, 이는 가 보다 더 크고 무겁기 때문이다.
1803년에 돌턴은 몇 가지 물질에 대한 상대적 원자량 목록을 발표했다. 1805년에 논문으로 출간되었으나, 자세한 내용은 1807년 토머스 톰슨의 책과 1808년과 1810년에 돌턴의 책으로 출판되었다.
돌턴은 수소를 기본 단위로 삼아 원자량을 정했다. 그러나 그는 일부 원소가 분자로 존재한다는 것(예: 산소 분자 )과, 두 원소 간의 가장 간단한 화합물이 항상 각 원소 하나씩의 결합(물은 가 아니라 )이라고 잘못 생각했다. 이와 장비의 열악함 때문에 그의 원자량 표는 오류가 있었다. 예를 들어 그는 산소 원자가 수소 원자보다 5.5배 무겁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16배 무겁다.[1]
3. 1. 모델의 특징
원자는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단단한 구 형태이다.[1] 19세기 초반, 존 돌턴은 모든 화학 원소는 변하지 않고 파괴할 수 없는 한 종류의 원소들로 구성되고 그것들이 결합하여 더 복잡한 구조를 이룬다(화합물)는 원자 이론을 발전시켰다.[1]
3. 2. 모델의 성립 계기
원자는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단단한 모양의 강체 구와 같은 형태로 되어있다. 질량 보존의 법칙에서 볼 때 물질은 근본적으로 부술 수 없고 기본적인 원소의 결합에 따라 화합물이 된다고 생각하였다.
3. 3. 역사적 맥락
19세기 초, 존 돌턴은 모든 화학 원소는 변하지 않고 파괴할 수 없는 한 종류의 원소들로 구성되고 그것들이 결합하여 더 복잡한 구조(화합물)를 이룬다는 원자 이론을 발전시켰다. 돌턴이 이 이론에 어떻게 도달했는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원자설을 통해 화학 분야에서 당시 과학자들이 이룬 많은 발견들을 설명할 수 있게 되었다.
돌턴은 프루스트의 업적을 연구하고 확장하여 배수 비례의 법칙을 발전시켰다. 이 법칙은 두 원소가 하나 이상의 화합물을 만드는 경우에는 첫 번째 원소 일정량과 결합하는 두 번째 원소의 질량 사이에 간단한 정수비가 성립한다는 법칙이다. 돌턴은 "nitrous air"(nitrous air영어) ()와 에 관한 연구를 통해 이 법칙을 발견했다. 이 기체들은 특정 조건에서 다른 비율로 결합하여 다른 화합물을 형성했다.(와 )
:
또한 돌턴은 물이 기체마다 다른 비율로 흡수하는 현상도 기체 입자의 질량과 복잡도의 차이로 설명했다. 예를 들어, 물은 질소()보다 이산화탄소()를 더 많이 흡수하는데, 가 보다 더 크고 무겁기 때문이다.
1803년에 돌턴은 몇 가지 물질에 대한 상대적 원자량 목록을 발표했다. 1805년에 논문으로 출간되었으나, 자세한 내용은 1807년 토머스 톰슨(Thomas Thomson)의 책과 1808년과 1810년에 돌턴의 책으로 출판되었다.
돌턴은 수소를 기본 단위로 삼아 원자량을 정했다. 그러나 그는 일부 원소가 분자로 존재한다는 것(예: 산소 분자 )과, 두 원소 간의 가장 간단한 화합물이 항상 각 원소 하나씩의 결합(물은 가 아니라 )이라고 잘못 생각했다. 이와 장비의 열악함 때문에 그의 원자량 표는 오류가 있었다. (예: 산소 원자가 수소 원자보다 5.5배 무겁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16배 무겁다.)
이러한 문제점은 1811년 아마데오 아보가드로에 의해 수정되었다. 아보가드로는 같은 부피의 기체는 같은 온도와 압력에서 같은 수의 분자를 가진다고 제안했다. (기체 입자의 질량은 부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아보가드로의 법칙으로 그는 많은 기체들이 2원자 분자로 존재함을 밝혔다. (예: 2리터의 수소는 1리터의 산소와 반응하여 2리터의 수증기를 만든다. 이는 산소 분자가 둘로 나뉜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보가드로는 산소와 다른 원소의 원자량을 더 정확하게 계산했고, 원자와 분자의 구별을 명확히 하였다.
1827년, 로버트 브라운은 물에 부유하는 입자가 이유 없이 흔들리는 현상(브라운 운동)을 관찰했다. 1905년,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은 브라운 운동이 물 분자의 끊임없는 충돌 때문이라는 이론을 세우고 수학적 모델을 만들었다. 이 모델은 장 페랭(Jean Perrin프랑스어)에 의해 실험적으로 증명되어 입자설을 뒷받침했다.
4. 톰슨 모형
조지프 존 톰슨이 음극선을 연구하며 전자를 발견하면서, 더 이상 원자를 나눌 수 없다는 생각은 깨지게 되었다. 톰슨은 크룩스 관 실험을 통해 음극선이 전기장이나 자기장에 의해 휘는 것을 확인하고, 이것이 음전하를 띤 입자, 즉 "미립자(corpuscles)"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아냈다. 이 미립자는 나중에 전자로 불리게 된다.[1][2]
톰슨은 전자가 원자에서 나온다고 보았고, 원자가 전기적으로 중성이어야 하므로 양전하를 띤 바탕에 전자가 박혀 있는 건포도 푸딩 모델을 제안했다.
이후 원자가 실제로 나뉠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입자를 나타내기 위해 ‘기본 입자’라는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했다.
4. 1. 모델의 특징
원자 안에 전자가 박혀 있는 형태이다. 원자는 전기적으로 중성이므로 같은 양의 양(+)전하가 있어야 한다. 교과서 및 많은 글에서 건포도처럼 박혀 있다는 식의 표현이 나와서 전자가 움직임 없이 정지되어 있는 듯한 인상을 주나, 실제로는 전자가 그 상태에서 움직일 수 있는 모델이다.원자들은 쪼갤 수 없는 가장 작은 단위라고 생각되었지만, 1897년에 조지프 존 톰슨이 음극선을 연구하며 전자를 발견하면서 더 이상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크룩스 관은 두 전극이 진공에 의해 분리되어 있는 봉인된 유리 용기이다. 양쪽 전극에 전압이 걸리면 음극선이 발생하여 튜브 반대편의 유리 부분에 도달해서 빛나는 곳을 만든다. 실험을 통해, 톰슨은 그 광선이 전기장을 걸어줌으로써 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자기장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톰슨은 이 광선들이 파동이기보다는 음으로 대전된 입자로 구성되어 있다고 결론지었다. 그는 이 입자를 "미립자(corpuscles)"라고 불렀고 이것은 나중에 다른 과학자에 의하여 전자로 명명되었다.[1][2]
톰슨은 전자들이 전극의 원자들에게서 온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는 원자를 더 쪼갤 수 있고 전자들이 원자를 구성하는 요소라고 생각했다. 원자는 전기적으로 중성이기 때문에 그는 양전하 바다 또는 구름을 전자들이 떠다닌다고 생각했다. 이것이 건포도 푸딩 모델이다.
원자들이 실제로 나뉠 수 있다는 것이 알려진 이후, 물리학자들은 나눌 수 없는 입자를 묘사하기 위하여 ‘기본 입자’라는 말을 사용하게 되었다.
4. 2. 모델의 성립
전자가 발견되면서 더 이상 나눌 수 없다는 원자에 대한 관념이 깨지고, 원자를 구성하는 요소를 설명하는 방편으로 제안되었다.[1] 이는 원자 안에 전자가 박혀 있는 형태이며, 원자는 전기적으로 중성이므로 같은 양의 양전하가 있어야 한다.[1]4. 3. 역사적 맥락
원자는 쪼갤 수 없는 가장 작은 단위라고 생각되었지만, 1897년에 조지프 존 톰슨이 음극선을 연구하며 전자를 발견하면서 더 이상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크룩스관은 두 전극이 진공에 의해 분리되어 있는 봉인된 유리 용기이다. 양쪽 전극에 전압이 걸리면 음극선이 발생하여 튜브 반대편의 유리 부분에 도달해서 빛나는 곳을 만든다. 실험을 통해, 톰슨은 그 광선이 전기장을 걸어줌으로서 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자기장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톰슨은 이 광선들이 파동이기보다는 음으로 대전된 입자로 구성되어 있다고 결론지었다. 그는 이 입자를 "미립자"라고 불렀고 이것은 나중에 다른 과학자에 의하여 전자로 명명되었다.[1][2]톰슨은 전자들이 전극의 원자들에게서 온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는 원자를 더 쪼갤 수 있고 전자들이 원자를 구성하는 요소라고 생각했다. 원자는 전기적으로 중성이기 때문에 그는 양전하 바다 또는 구름을 전자들이 떠다닌다고 생각했다. 이것이 건포도 푸딩 모델이다.
원자들이 실제로 나뉠 수 있다는 것이 알려진 이후 물리학자들은 나눌 수 없는 입자를 묘사하기 위하여 ‘기본 입자’라는 말을 사용하게 되었다.
5. 러더퍼드 모형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을 통해 원자의 조성이 균일하지 않으며 중심에 질량이 뭉쳐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1]
톰슨의 건포도 푸딩 모델은 1909년에 그의 제자 중 하나인 어니스트 러더퍼드에 의하여 부정되었다. 러더퍼드는 금박 실험을 통해 대부분의 질량과 양전하가 매우 작은 부피 안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러더퍼드의 동료였던 한스 가이거와 어니스트 마즈든은 얇은 금박에 알파 입자를 통과시켜 형광 스크린에 쏘는 실험을 진행했다. 전자의 질량은 매우 작은 반면, 알파 입자의 운동량은 매우 컸고, 톰슨의 건포도 푸딩 모델에서는 양전하가 넓게 퍼져 분포한다고 보았기 때문에, 모든 알파 입자들이 휘거나 흡수되지 않고 직진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러나 놀랍게도 일부 입자는 매우 강하게 휘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러더퍼드는 원자를 태양계와 비슷한 모형으로 생각했으며, 이는 이후 전자가 핵 주위를 돈다는 보어의 모형으로 이어졌다.[1]
5. 1. 모델의 특징
원자의 질량 대부분은 핵에 뭉쳐 있고, 이 핵에는 양전하가 분포하고 있다. 원자 내부의 대부분은 비어 있으며, 전자는 핵 주변을 돌고 있다.[1]어니스트 러더퍼드는 원자의 질량과 양전하 대부분이 매우 작은 부피에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러더퍼드의 동료였던 한스 가이거와 어니스트 마즈든은 금박 실험에서 알파 입자를 얇은 금박에 통과시켜 형광 스크린에 쏘았다. 전자는 질량이 매우 작은 반면, 알파 입자는 운동량이 매우 크고, 톰슨의 건포도 푸딩 모델에서는 양전하가 넓게 퍼져 분포한다고 보았기 때문에, 알파 입자 모두가 휘거나 흡수되지 않고 직진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나 놀랍게도 일부 입자는 매우 강하게 휘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러더퍼드는 원자의 태양계 모델을 고안했으며, 이는 이후 보어의 모형으로 이어져 전자가 핵 주위를 돈다는 개념으로 발전했다.[1]
5. 2. 모델의 성립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을 통해 원자 조성이 균일하지 않으며 중심에 질량이 뭉쳐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1]Ernest Rutherford|어니스트 러더퍼드영어는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을 통해 원자핵의 존재를 확인했다. 러더퍼드는 이 실험을 통해 질량 대부분이 뭉쳐 있는 핵이 존재하며, 여기에 양전하가 분포하고 있고, 원자 내부 대부분의 공간은 비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또한 전자가 핵 주변을 돌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1]
5. 3. 역사적 맥락
톰슨의 건포도 푸딩 모델은 1909년에 그의 제자 중 하나인 어니스트 러더퍼드에 의하여 부정되었다. 러더퍼드는 대부분의 질량과 양전하가 매우 작은 부피 안에(그는 그것이 원자의 중심이라고 추측했다.)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1]금박 실험에서, 러더퍼드의 동료였던 한스 가이거와 어니스트 마즈든(Ernest Marsden)은 얇은 금박을 통과시킨 알파 입자를 형광 스크린에 충돌시켰다.[1] 전자 질량은 매우 작고, 알파 입자의 운동량은 매우 크며, 건포도 푸딩 모델에서 양전하는 넓게 퍼져 분포하므로, 모든 알파 입자들이 휘거나 흡수되지 않고 직진할 것으로 예상되었다.[1] 그러나 놀랍게도, 일부 입자는 매우 강하게 휘었다.[1] 이 결과를 바탕으로 러더퍼드는 원자의 태양계 모델을 고안했으며,[1] 이는 이후 행성이 태양 주위를 도는 것과 같이 전자가 핵 주위를 돈다는 보어의 모형으로 이어졌다.[1]
6. 보어 모형
보어 모형은 기존의 원자 모형이 수소 원자의 불연속 스펙트럼을 설명하지 못하고, 고전 전자기 이론과도 맞지 않았기 때문에 제시된 가설이다.[1]
6. 1. 모델의 특징
전자는 불연속적인 특정 궤도만을 가지며 이때 전자는 에너지 방출 없이 안정하다. 다른 궤도로 이행할 때 에너지가 방출되거나 흡수된다.[1] 1913년 방사선화학자 프레더릭 소디는 주기율표에 하나 이상의 원소들이 나타나는 것을 관찰하였다.[2] 마거렛 토드(Margaret Todd영어)는 이 원소들에 동위원소라는 이름을 붙였다.[2]같은 해, 조지프 존 톰슨은 양쪽 끝에 필름을 놓고 네온 이온을 자기장과 전기장에 흘려보내는 실험을 했다. 그는 양쪽에 빛나는 곳을 관찰했고, 이는 두 개의 다른 궤도를 의미했다. 톰슨은 일부 네온 이온이 다른 질량을 갖기 때문이라고 결론지었다. 이러한 질량 차이는 1932년 중성자가 발견되면서 밝혀졌다.
1918년, 어니스트 러더퍼드는 질소 기체에 알파 입자를 충돌시켜 수소 원자핵이 나오는 것을 관찰했다. 러더퍼드는 수소 핵이 질소 원자핵에서 나온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그는 어떤 원자의 양전하든지 수소 핵의 개수와 같다는 것을 알았다. 수소가 가장 가벼운 원소이고, 다른 모든 원소의 원자량이 대략 수소 원자량의 몇 배라는 사실에서 그는 수소 핵이 하나의 입자이며 모든 원자핵의 기본 구성 요소라고 결론지었다. 이것이 양성자이다. 이후 러더퍼드는 실험을 통해 대부분 원자핵의 질량이 양성자 질량을 넘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는 이 잉여 질량이 중성 입자에 의한 것이라고 추론하고, 시험적으로 ‘중성자’라고 불렀다.
1928년, 발터 보테는 베릴륨에 알파 입자를 충돌시키면 투과성이 강하고 전기적으로 중성인 방사선이 나오는 것을 관찰하였다. 이 방사선은 파라핀 왁스에서 수소 원자를 추출할 수 있었다. 처음에는 감마선이 금속에서 전자를 뽑아내는 것과 유사하여 높은 에너지를 가진 감마 방사선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제임스 채드윅은 그 효과가 전자기 복사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강하다는 것을 알아냈다. 1932년, 그는 수소, 질소 등 많은 원소를 “베릴륨 방사선”에 노출시켰다. 그리고 대전된 입자들의 에너지를 측정하여 방사선이 전기적으로 중성이면서 양성자와 같은 질량을 가진 입자로 구성되어 있다고 추론하였다. 채드윅은 중성자 발견으로 1935년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다.
6. 2. 모델의 성립
보어 모형은 전자가 불연속적인 특정 궤도만을 가지며 이때 전자는 에너지 방출 없이 안정하다는 점과 다른 궤도로 이행할 때 에너지가 방출되거나 흡수된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종래의 모델이 수소 원자의 불연속 스펙트럼을 설명할 수 없었고 고전 전자기 이론과도 맞지 않았기 때문에, 이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가정’ 으로서 보어 모형이 제시되었다.[1]6. 3. 역사적 맥락
프레더릭 소디는 1913년 방사성 붕괴 산물을 실험하면서 주기율표의 각 자리에 하나 이상의 원소들이 나타나는 것을 발견했다. 마거렛 토드(Margaret Todd영어)는 이러한 원소들을 설명하기 위해 동위원소라는 용어를 제안했다.같은 해, 조지프 존 톰슨은 네온 이온을 자기장과 전기장에 통과시켜 양쪽 끝 필름에 빛나는 지점을 관찰하는 실험을 했다. 그는 두 개의 다른 궤도를 발견하고, 일부 네온 이온이 다른 질량을 갖기 때문이라고 결론지었다. 이러한 질량 차이는 1932년 중성자의 발견으로 설명되었다.
1918년, 어니스트 러더퍼드는 질소 기체에 알파 입자를 충돌시켜 수소 원자핵이 방출되는 것을 관찰했다. 그는 수소 핵이 질소 원자핵에서 나온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이후 그는 모든 원자의 양전하가 수소 핵의 개수와 같다는 것을 발견하고, 수소 핵이 모든 원자핵의 기본 구성 요소이며, 양성자라고 결론지었다. 또한, 러더퍼드는 실험을 통해 대부분의 원자핵 질량이 양성자 질량보다 크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러한 잉여 질량이 알려지지 않은 중성 입자, 즉 ‘중성자’ 때문이라고 추론했다.
1928년, 발터 보테는 베릴륨에 알파 입자를 충돌시켰을 때 투과성이 강하고 전기적으로 중성인 방사선이 나오는 것을 발견했다. 이 방사선은 파라핀 왁스에서 수소 원자를 추출할 수 있었다. 처음에는 이것이 높은 에너지를 가진 감마 방사선이라고 생각했지만, 제임스 채드윅은 그 효과가 전자기 복사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강하다는 것을 알아냈다. 1932년, 채드윅은 수소, 질소 등 여러 원소에 “베릴륨 방사선”을 쬐어 반환되는 대전 입자의 에너지를 측정하여, 이 방사선이 전기적으로 중성이며 양성자와 비슷한 질량을 가진 입자로 구성되어 있다고 결론지었다. 채드윅은 이 중성자 발견으로 1935년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했다.
7. 현대 원자 모형
양자역학의 발전에 따라 슈뢰딩거 방정식을 기반으로 전자를 파동 함수로 기술하는 현대 원자 모형이 성립되었다. 이 모형은 스펙트럼 현상을 더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었다.[1]
원자의 태양계 모형(보어 모형/러더퍼드-보어 모형)은 몇 가지 단점을 가지고 있었다. 고전 전자기학의 라모 공식에 따르면 가속하는 전자는 전자기파를 방출하여 에너지를 잃고 핵으로 나선형 궤도를 그리며 돌진해야 했다. 또한, 원자가 불연속적인 스펙트럼의 빛만 방사하는 현상도 설명하지 못했다.[1]
20세기 초, 막스 플랑크와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은 빛의 에너지가 불연속적인 양으로 흡수되거나 방사된다는 가정을 통해 양자 이론을 발전시켰다. 1913년, 닐스 보어는 이러한 아이디어를 보어 모형에 도입하여 전자가 정해진 각운동량과 에너지를 갖는 특정 궤도만 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모형에서 전자는 핵으로 나선형으로 돌진하지 않으며, 에너지 준위 변화에 따라 빛을 방출하거나 흡수한다고 보았다.[1]
그러나 보어 모형은 수소의 스펙트럼 선만 예측 가능했고, 다전자 원자에는 적용할 수 없었다. 스펙트럼그래픽 기술 발전으로 보어 모델이 설명할 수 없는 수소 스펙트럼 선이 추가로 발견되었다. 1916년, 아르놀트 조머펠트는 타원 궤도를 도입하여 추가적인 스펙트럼 선을 설명하려 했지만, 이 모델은 사용하기 어려웠고 복잡한 원자는 설명할 수 없었다.[1]
1923년, 루이 드브로이는 모든 움직이는 입자가 파동성을 가진다고 제안했다. 에르빈 슈뢰딩거는 이 아이디어에 영향을 받아 전자의 움직임을 파동으로 설명하고자 했다.
7. 1. 모델의 특징
전자는 고전적인 원형 궤도가 아닌, 원자 오비탈로 정의되는 파동 함수로 기술된다. 이 파동 함수는 전자를 발견할 확률 분포로 나타낸다.[1]1926년에 발표된 에르빈 슈뢰딩거의 슈뢰딩거 방정식은 전자를 점 입자가 아닌 파동 함수로 묘사한다. 막스 보른은 이 방정식을 이용하여 핵 주위 특정 위치에서 전자를 발견할 확률을 계산했다.[1]
불확정성 원리에 따라, 전자의 위치와 운동량을 동시에 정확히 아는 것은 불가능하다. 현대 원자 모형은 전자의 위치를 확률로 나타내며, 전자는 핵에서 떨어진 어떤 위치에서도 발견될 수 있지만, 에너지 준위에 따라 특정 영역에 존재할 확률이 더 높다. 이러한 패턴을 원자 궤도라고 부른다.[1]
7. 2. 모델의 성립
양자역학의 발전에 따라 성립되었다. 입자가 아닌 파동함수로서 스펙트럼 현상을 더욱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다.7. 3. 역사적 맥락
양자역학의 발전에 따라, 전자를 발견할 확률에 대한 파동함수로 원자 오비탈을 정의하는 현대 원자 모형이 성립되었다. 이 모형은 입자가 아닌 파동함수로서 스펙트럼 현상을 더욱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다.원자의 태양계 모형(보어 모형/러더퍼드-보어 모형)은 몇 가지 단점이 있었다. 고전 전자기학의 라모 공식에 따르면 가속하는 전자는 전자기파를 방출하므로, 궤도를 도는 전자는 점차 에너지를 잃고 핵을 향해 나선 궤도로 돌진하게 된다. 또한, 원자가 불연속 스펙트럼의 빛만 방사하는 현상도 설명하지 못했다.
20세기 초, 막스 플랑크와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이 빛의 에너지가 불연속적인 양으로 흡수되거나 방사된다는 것을 가정하면서 양자 이론이 물리학을 혁명적으로 바꾸었다. 1913년, 닐스 보어는 이러한 아이디어를 보어 모형에 도입하여 전자는 정해진 각운동량과 에너지를 갖는 특정한 준위의 궤도만 돌 수 있고, 핵으로부터 떨어진 거리는 에너지와 비례한다고 설명했다. 이 모형에서는 전자가 핵을 향해 나선으로 돌진하지 않으며, 에너지 준위를 오르내릴 때에만 에너지 출입이 일어나고, 이때 에너지 변화에 비례하는 진동수를 갖는 빛이 방출되거나 흡수된다고 보았다.
그러나 보어 모형은 수소의 스펙트럼 선만 예측할 수 있었고, 다전자 원자에는 적용되지 않았다. 또한, 스펙트럼그래픽 기술 발전으로 보어 모델이 설명할 수 없는 추가적인 수소 스펙트럼 선이 발견되었다. 1916년, 아르놀트 조머펠트는 추가적인 스펙트럼 선을 설명하기 위해 타원 궤도를 도입했지만, 이 모델은 사용하기 어려웠고 복잡한 원자를 설명할 수 없었다.
1923년, 루이 드브로이는 모든 움직이는 입자가 파동과 같은 성질을 띤다는 것을 제안했다. 에르빈 슈뢰딩거는 이 아이디어에 매료되어 1926년에 발표된 슈뢰딩거 방정식에서 전자를 점 입자가 아닌 파동함수로 기술하였다. 이는 보어 모델이 설명하지 못했던 많은 스펙트럼 현상을 훌륭하게 설명하였다. 그러나 이 개념은 가시화하기 어려워 반대에 부딪혔다. 막스 보른은 슈뢰딩거 방정식을 전자의 가능한 상태로 가정하여 핵 주위 주어진 위치 주변에서 전자를 찾을 확률을 계산하는 데 이용하였다.
파동함수는 시간과 위치를 통합시키기 때문에, 주어진 지점에서 위치와 운동량을 동시에 아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것은 불확정성 원리로 알려져 있으며, 보어 모형의 명확한 전자 궤도를 부정한다.
현대 원자 모델은 전자의 위치를 위치 가능성으로 기술한다. 전자는 핵에서 떨어진 어떤 위치에서도 발견될 수 있지만, 에너지 준위 때문에 핵 주변의 특정 영역에 존재할 확률이 더 높다. 이 패턴이 원자 궤도와 관련이 있다.
참조
[1]
웹인용
Nobel Lecture: Carriers of Negative Electricity
http://nobelprize.or[...]
The Nobel Foundation
2008-08-25
[2]
저널
George Johnstone Stoney, F.R.S., and the Concept of the Electron
Royal Society
1975-03-00
본 사이트는 AI가 위키백과와 뉴스 기사,정부 간행물,학술 논문등을 바탕으로 정보를 가공하여 제공하는 백과사전형 서비스입니다.
모든 문서는 AI에 의해 자동 생성되며, CC BY-SA 4.0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키백과나 뉴스 기사 자체에 오류, 부정확한 정보, 또는 가짜 뉴스가 포함될 수 있으며, AI는 이러한 내용을 완벽하게 걸러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되는 정보에 일부 오류나 편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중요한 정보는 반드시 다른 출처를 통해 교차 검증하시기 바랍니다.
문의하기 : help@durumis.com